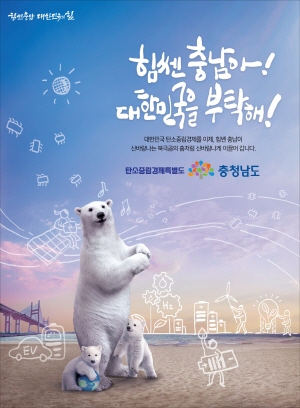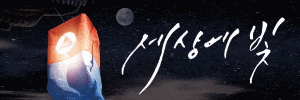보스턴 미술관에서는 2025년 7월 <깊은 물 Deep Waters>전을 ‘당신의 예술가들과 바다’라는 부제(副題)로 전시를 하고 있다. 수 세기에 걸쳐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은 파도 속에서 살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의 경험을 되짚어 보며 바다의 아름다움과 공포를 탐구해 왔다. 미술관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오픈런을 하니 삼층 전시실에는 관람객이 아무도 없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볼 수 있었다. 마침 <반 고흐: 룰랭 가족 초상화>전이 열리고 있어 그곳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서양을 마주하며 작업한 네 명의 예술가들 중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이며, 내가 보고 싶었던 조지 말로드 월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노예선>이 가장 먼저 전시되고 있었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니 세로 90cm, 가로 122.6cm인 작품 크기에 몹시 놀랐다.

터너는 영국 최고의 풍경화가이지만, 사교적이지 못하고 화를 잘 내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영국은 악센트로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강한 노동계급 악센트를 결코 바꾸지 않을 정도로 고집스러웠다. 동시대의 풍경화가로 영국 밖이라곤 나간 적이 없던 콘스터블과 대조적으로 터너는 영국과 유럽 전역을 강박적으로 여행했다. 1851년 사망했을 당시, 터너는 자신의 성공비결이 엄청난 노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런던에서 이발사이며 가발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터너의 아버지는 골프 대디처럼 평생 지극 정성이었다. 어린 터너가 그림을 그리면 이발소 창가에 진열해 놓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신병자였다. 터너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애처로움 마음에, 재능 있는 터너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

터너는 선배화가인 조슈아 레이놀즈(Joshua Reynolds, 1723~1792)가 “정리된 위계에 따라 그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역사적 사건, 신화나 문학, 성경이 가장 상위 등급이고 일상생활을 담은 장르화,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는 저급한 범주에 속했다. 그래서 터너는 40년간 표현에서 풍경화가 역사화와 맞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드 블리에르의 바다 풍경은 단순한 자연 묘사에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인의 삶과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부존 자원이 없는 네덜란드인들에게 바다는 생존의 공간이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하는 매개체이다.
1790 년대 중반, 터너는 17세기 네덜란드 해양화와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 1600~1682)의 이상화 된 풍경화를 보고 배웠다. 로랭은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풍경 화가였지만 이탈리아에서 거의 활동했다. 로랭은 동시대인 네덜란드의 풍경화가를 제외하고 초기 풍경화 발전에 매우 중요한 화가였다. 그는 성경이나 고전 신화의 장면에 적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격조 높은 역사화로 풍경화를 격상시켰다. 터너는 로랭의 영향으로 18세기 후반 자연의 장엄함을 지닌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숭고미’에 천착했다.
버크는 1757년 '숭고와 아름다움의 관념의 기원에 철학적 탐구'에서 숭고(sublime)이라는 미의 개념에 심취했다. 버크는 숭고를 아름다움보다 우선되는,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경험으로 정의했다. 버크는 숭고함이 공포와 고통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쾌감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내가 직접 부딪친 공포와 고통과 달리 그림이나 문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때는 안전하기에 쾌감과 경외심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숭고함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 광대함, 무한함, 어둠, 고독, 소리, 격렬함 등을 제시했다.
버크의 숭고 이론은 미학뿐만 아니라, 정치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숭고 개념은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전환하는 트리거가 되었다. 이후 드니 디드로와 칸트, 쇼펜하우어 등 후대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버크에게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도덕적인 요소도 담고 있었는데, 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터너는 숭고미에 관심이 많아 황홀한 자연 경관을 찾아 나섰다.

터너가 살아있는 동안 영국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 애국심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 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은 영국인들에게도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공화국 수립에 실패한 나폴레옹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연이어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
1805년 10월 21일 호라티오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이 스페인 해안 트라팔카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격파하면서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러나 넬슨이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영국인들은 승전의 기쁨과 영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감내해야 했다.
높이 솟은 돛대와 찢어진 돛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쏟아지는 대포의 포연 속에서 넬슨 제독의 목숨을 앗아간 결정적인 순간을 터너는 매우 독창적으로 재현하였다. 터너에게 이 전투는 평생 커다란 관심사였다.

증기기관차과 그 부산물인 속도는 터너 시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다.
특히 철도는 사람들이 거리, 속도,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기차는 유사 이래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속도로 달리며 특히 ‘속도’라는 추상적인 사고체계를 만들었다.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앨버트 공은 기차에 관심이 없는 여왕을 설득해 전 영국에 레일을 깔고 새로운 문물인 증기기관차로 산업화를 이루길 원했다. 당시 기술력은 템즈 강 아래로 관통하는 지하터널이 준공되었고 여왕이 준공식에 참석할 정도였다. 터너는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를 그린 이 그림으로 '철도 열풍'을 유화에 불러온 최초의 화가였다. 파이어플라이 기관차가 메이든헤드 다리 위에서 시속 80~96km로 템스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영국 전역에 새로운 철도망이 구축되면서 철도는 지역 간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였다.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철도를 이용해 접을 수 있는 이젤과 아연 물감 튜브 덕분에 그리고 싶은 곳이면 어디에나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는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클로드 모네의 <생 라자르 역> 연작을 보면 기차와 사람들 그리고 주변 건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다. 모네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증기였고, 증기를 주인공으로 그린 그의 발상이 무척 신선하고 놀라웠다.
모네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역장을 찾아가 “내가 유명한 화가인데 이 역을 그리고 싶다”고 딜을 했다. “만약 거절하면 다른 역으로 가겠다”고 하자 역장이 기관사에게 증기를 최대한 내뿜게 하였다. 화면 전체를 감싸는 뿌연 증기로 모든 형태는 사라진다. 하얗고 푸르며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뒤엉킨 증기만 남았다. 그래서 이후 기차에 매혹된 모네는 물론 마네, 드가, 모리조, 반 고흐, 앙리 루소 등의 작품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기차를 찾아보곤 했다.
이후 33년 전에 그려진 터너의 <비, 증기, 그리고 속도, 1844>를 보곤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이 작품은 추상화와 상징주의 그리고 운동감을 묘사하는 것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미래주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 원근법으로 소실점인 중앙에서 출발하는 철로를 기차는 겨우 연통만 보이는 실루엣으로 묘사된다. 증기기관차의 속도감은 마치 영화 <박하사탕>의 클라이맥스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하며 설경구가 “나 다시 돌아 갈래”를 외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왼쪽으로 뻗어가는 낡은 도로가 놓인 아치형 다리와 작은 보트는 과거의 느긋한 여정을 상징한다.
최금희 작가는 미술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을 답사하며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미술 사조, 동료 화가, 사랑 등 숨겨진 이야기를 문학, 영화, 역사, 음악을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50플러스센터 등에서 서양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81)](/data/kuk/image/2025/08/11/kuk20250811000061.png)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82)](/data/kuk/image/2025/08/17/kuk20250817000033.png)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80)](/data/kuk/image/2025/08/01/kuk202508010003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