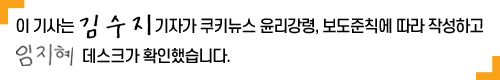1954년 하동환자동차공업사로 출발한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KGM)로 사명을 바꾼 지 1년 반, 여전히 ‘생존’과 ‘도약’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 KG그룹 인수로 한숨 돌린 KGM은 수출 중심 체질 전환과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로 ‘부활의 방정식’을 다시 쓰고 있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반등세가 뚜렷하다.
KGM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362억원, 영업이익 17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71% 증가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판매는 1만137대(-14%)에 그쳤지만, 유럽과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수출이 각각 39%, 239% 늘면서 전체 판매는 2만7263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판매는 1만8321대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반면 수출(CKD 포함)은 3만4951대로 7.3% 증가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구조”라며 “수출선 다변화와 원가 절감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 속 수출이 성장 견인
실적 반등의 핵심은 단연 ‘무쏘 EV’다. 지난 3월 출시된 국내 유일 전기 픽업인 무쏘 EV는 출시 6개월여 만에 누적 6000대 판매를 돌파하며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무쏘 EV는 3월 526대, 5월 1167대, 7월 1339대, 8월 1040대 등 월평균 1000대 안팎의 안정적 판매를 유지하며 브랜드 부활의 동력이 됐다. 실구매가 3000만원대 후반으로 접근성이 좋고, 최대 500kg 적재 능력 등 실용성이 호평을 받았다.
KGM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픽업 시장 정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쏘 EV는 정통 픽업 브랜드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판매 호조로 친환경차 비중은 전체의 28%까지 확대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무쏘 EV 2449대, 토레스 하이브리드 1480대가 신규 수요를 이끌었다.
내수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KGM은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시장에서 론칭 행사를 이어가며 수출 물량도 확대하고 있다. 8월 판매는 내수 4055대, 수출 4805대를 포함해 886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9% 늘었다. 9월에는 내수 4100대, 수출 6536대를 합쳐 총 1만636대를 판매하며 올해 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수출은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했다. 무쏘 EV(654대), 토레스 HEV(392대), 액티언 HEV(705대), 토레스 EVX(1303대) 등 친환경 차 라인업이 호조세를 이끌었다.
KGM의 중장기 전략은 ‘SUV·픽업 중심의 수출 확대’에 맞춰져 있다. KG그룹 인수 이후 자금 유동성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은 300% 수준으로 높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가운데, 유럽·중남미 등 틈새 수출 시장이 실적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
송 연구원은 “KGM은 높은 비용 구조와 낮은 영업이익률 탓에 Valuation(기업가치)이 저평가돼 있다”며 “낮은 환율 환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출 물량 확보와 미래 기술 협업이 재평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SUV 명가의 다음 관문… ‘지속 가능한 수출기업’으로
KGM은 2030년가지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신차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중대형 SUV ‘SE10(프로젝트명)’과 내년 상반기 무쏘 스포츠&칸 가솔린 엔진 픽업 트럭 ‘Q300(프로젝트명)’이 대기 중이며, 포트폴리오 확장이 향후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KGM의 체질 개선이 단기간 내 가시화되긴 어렵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쟁력 회복과 기술 개발 역량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KGM은 세단 라인업이 없고 SUV·픽업트럭 중심이어서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며 “현대차그룹과 비교해 기술력이나 완성도 면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이 한정된 만큼 중진국 중심의 해외 다변화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며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모델의 파생형이 아닌 새로운 핵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