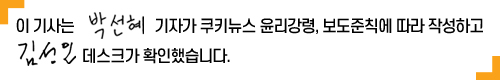자녀의 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호르몬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약인 만큼 장기적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성장호르몬 제제 시장은 최근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 2019년 약 1400억원 규모였던 시장은 2023년 약 4445억원으로, 연평균 30%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저신장증(처방코드 E343)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2019년 3만4600명에서 2023년 5만1280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특발성 저신장에 사용하는 주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등 피하조직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대개 어린 나이에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 저신장 정도가 심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고 투여 용량이 충분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진단·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처방하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4종으로,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지노트로핀’, 독일 머크의 ‘싸이젠’, 동아ST ‘그로트로핀’, LG화학의 ‘유트로핀’이 있다.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국산 제품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제품 간 안전성 데이터를 살펴보면 차이는 있다. 지노트로핀의 경우 198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30년 이상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유트로핀과 그로트로핀은 1990년대 초·중반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장기 데이터뿐 아니라 투약 방식이나 보관 조건 등 편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한다.
김진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바로웰병원 원장)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혈당을 올리거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약인 만큼 장기적 임상 데이터를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자가 투여해야 하다 보니 기기 사용법이나 주사 횟수 등 편의성도 중요하다”며 “수입 제품이 편의성 면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최근에는 국산 제품도 펜형이나 자동주사기 등으로 개선돼 사용성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키 크는 주사로 오해해 정상 아이들까지 투여 받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의학적으로 성장 곡선 하위 3% 미만인 특발성 저신장증으로 진단 받았을 때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성장클리닉에서 이 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투약을 권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부작용 보고가 많은 약물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18년 320건에서 2022년 1604건으로 약 5배 늘었다. 대개 주사 부위 통증, 출혈, 두통, 오심 등 경미한 증상이었지만, 일부는 호르몬계 이상이나 부종, 관절통 등을 호소했다. 김 전문의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2~3년간 주 6~7회 투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호르몬 제제는 반드시 저신장증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의학적 판단을 갖고 투여해야 하며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면서 “약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이의 전반적 생활습관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키 성장을 돕는 기본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