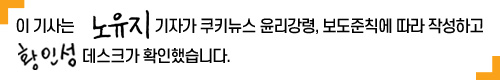서울시가 ‘혁신 교통수단’으로 내세운 한강버스가 운항 일주일 만에 안전 논란에 휘말렸다.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승선 신고와 안전 조치가 승객 자율에 맡겨진 채 사고까지 발생했다. 운항 초기부터 잇단 고장도 겹치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QR코드 의존, 사실상 ‘자율 안전’
한강버스 탑승객 유의 사항과 승선 신고는 QR코드에 의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에 그쳤다.
25일 오전 잠실 출발 마곡행 한강버스. 승무원은 “갑판으로 나가려면 승선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확인 절차는 없었다. 담당 기관장조차 “신고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갑판 위 사고 발생…“아기 안고 있다 발목 접질려”
질서 유지에도 한계가 뚜렷했다. 기관장이 출발과 도착 전 “앉아 달라”고 직접 안내했지만, 선 채로 움직이다 뒤늦게 앉는 승객이 많았다.
실제 이날 압구정에서 여의도로 향하던 중 큰 너울에 배가 흔들리자 60대 여성 A씨가 생후 1년도 안 된 손녀를 안은 채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갑판 위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 난간 쪽에 서 있었다면 아기를 물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티캣과 대조…안전 매뉴얼은 ‘나중에’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호주 브리즈번의 ‘시티캣’은 홈페이지에 별도 안전 안내 항목을 두고, “좌석이 있으면 짧은 여정이라도 착석하라” “어린이와 함께라면 손을 잡고 대기·탑승하라” 등 세세한 지침을 운영한다.
반면 한강버스는 안전 매뉴얼을 이제야 제작 중이며, 승객 관리 전담 인력 충원 계획도 없다. 현재는 선장·기관장 등 운항 인력이 안전 통제까지 맡고 있다.
운항 중단만 세 번째…시민 불안 가중
고장도 잇따랐다. 지난 25일 마곡 출발 잠실행 노선은 방향타 이상으로 회항했고, 앞서 전기 계통 고장으로 두 차례 운항이 중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사 기간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도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선박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체험 수요 확인’에만 치중한 채 기본 안전 관리 체계를 소홀히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된 한강버스는 출발부터 안전 관리 미흡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