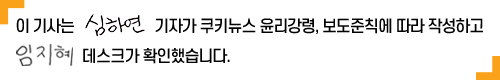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지만, K-패션 브랜드의 존재감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K-뷰티 기업이 다양한 협찬과 전시를 통해 글로벌 홍보전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뷰티 기업은 행사 기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의 美(미)를 알린다. 경주 황룡원에서 운영되는 K뷰티 전시관이 대표적이다. APEC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브랜드 ‘더후’의 ‘환유’ 라인 제품을 선보이며, 손대현 나전칠기 장인이 현장에서 공예 시연을 진행해 브랜드 정체성을 전한다.
아모레퍼시픽은 K뷰티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메이크업쇼를 선보인다. 에이피알은 인기 미용기기 ‘부스터 프로’를 세계 각국 참가자들에게 협찬해 K뷰티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샘물은 K메이크업 기술을 소개하고,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채 색상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제품을 제안한다. 구미대학교 역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K에스테틱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CJ올리브영은 경주 지역 4개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K뷰티 클렌저 본품을 증정하고,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투숙 외국인에게 마스크팩과 세럼 샘플 키트를 제공한다.
반면 패션업계는 조용하다.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 마뗑킴이 APEC 참가자들에게 카드지갑과 캔버스백을 제공하지만, 그게 전부다. 이외에는 이번 APEC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패션 브랜드가 없다.
패션업계가 이번 APEC 무대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는 최근 K패션 산업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현실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션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포지셔닝이 뚜렷하지 않고, 국제행사나 패션위크에 대한 투자도 위축돼 있다.
또한 명품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시장 구조 속에서 국내 브랜드가 설 자리가 좁아졌으며, 한류 콘텐츠에 의존한 홍보 방식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니클로·자라·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가 ‘가성비’와 ‘빠른 트렌드 반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한 반면, 소비 여력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나이키·아디다스·뉴발란스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브랜드는 ‘중간 가격대’라는 애매한 포지션에 머물며 저가 시장에서는 밀리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헤리티지를 갖춘 해외 브랜드와 맞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패션 유통 구조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대형 복합몰과 백화점 입점 수수료가 여전히 높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브랜드 개별 경쟁력보다는 ‘입점 노출’ 중심의 판매 전략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은 줄고, 단기 매출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국내 패션 브랜드를 운영 중인 양모씨(41)는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건 단순히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브랜드 육성보다는 유통 효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패션은 기획력과 문화 해석이 핵심인데,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APEC을 계기로 “뷰티뿐 아니라 패션 역시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패션이 다시 국제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 홍보가 아닌 브랜딩·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패션 기업 관계자는 “K뷰티는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노출되고 있지만, 패션은 여전히 컬렉션과 오프라인 전시 중심이라 기회의 폭이 좁다”며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중소 브랜드가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패션의 문제는 세대 교체보다 ‘산업 체력’의 부족에 있다”며 “신진 디자이너 발굴과 브랜드 육성, 유통 수수료 절감,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