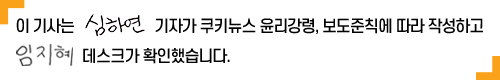“유행에 맞춰 옷을 사고 스타일링을 하는 편인데, 가격대가 있는 걸 여러 벌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서요. 특히 여름 옷은 최대한 가성비를 따져서 사는 편이에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지만 패션업계는 여전히 한파다. 특히 고물가와 소비 침체로 소비자가 ‘가성비’ 의류를 주로 찾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1분기 매출은 5043억8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173억7200만원 대비 2.51%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341억7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41억1600만원 대비 36.84% 줄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629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줄었고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올해 1분기 매출은 3042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 58.3% 줄었다.
패션 기업의 실적 하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패션업계의 경영 성적표는 초라했다. 패션 상장사 49개와 비상장사 49개 등 총 98개사의 2024년 실적(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17.7% 감소했다.
반면면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들만이 선방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연매출 1조601억원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다시 입성했다. 탑텐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970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실적을 냈다. 이랜드 스파오 역시 약 6000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5%가량 늘어난 1조2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42)씨는 “요즘 손님이 너무 적어졌다. 예전보다 옷이 훨씬 안 팔린다”며 “4만 원만 넘어도 소비자들 사이에선 ‘비싸다’는 인식이 크다 보니 1만~1만5000원대 저가 옷을 파는 매장에 비해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어 원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서라도 할인을 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0% 이상 세일하는 상품도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가 매장은 상황이 달랐다. 9000원대부터 시작하는 저가 의류 매장에 가보니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까지 다양한 손님들로 붐볐다. 특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많았다. 대학생 박현주(22·여)씨는 “싸서 여러 스타일을 마음껏 입어볼 수 있어서 좋다”며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비싼 옷을 덜컥 사기엔 아직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싼 옷으로 여러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꼭 필요할 땐 비싼 옷을 신중히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같은 매장에서 쇼핑하던 직장인 김유나(29·여)씨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이 완벽하진 않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는 오히려 큰 것 같다”며 “큰돈 들여 옷 사기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유행도 금방 바뀌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여러 옷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성비를 앞세운 저렴한 패션 브랜드의 강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를 가장 우선에 두다 보니 중고가 브랜드는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트렌드에 맞춰 옷을 자주 바꿔 입는 소비 패턴이 고착화됐다. 가격 외에 디자인과 품질, 지속가능성 같은 뚜렷한 차별화 요소가 없으면 충성 고객층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결국 브랜드별로 재고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 가격 경쟁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