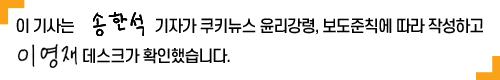“심판이 보이지 않을 때 좋은 경기가 이뤄진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심판이 지나치게 경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K리그 심판은 ‘지나치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휘슬이 울린 뒤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과 천안 경기에서 전남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판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심판이 “기계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긴 순간 현장은 들끓었다. 변명처럼 들린 답변은 불신을 낳았다.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구단에서 공문을 제출하면 패널 회의를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고 판정 논란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심판 비판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되면 심판이 다음 경기에 들어올 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판정 논란이 생기면 구단과 협회가 ‘조용히’ 소통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전남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다른 구단의 경우 심판 조직이 접수 담당자를 알려주지 않거나, 협회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쿠키뉴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단들은 절차를 제대로 밟았지만, 정작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구단들이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판정 이유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이어진다.
한 K리그 구단 관계자는 “심판위원장도 공문을 제출하면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공문 형태의 답변이 어렵다면 메일이나 전화로라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단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소통과 설명일 뿐인데 상식적 요구조차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구단은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순간, 문제는 오심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폐쇄성과 무책임으로 번진다.
최근 심판 간담회가 열렸지만 26개 구단 중 감독 상당수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단들 사이에서 “소통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K리그2는 판정 논란조차 주목받지 못한다. “2부는 어린 심판 양성의 장”이라는 심판위원장의 말 뒤에선 구단이 을(乙)로 취급받는 현실이 엿보인다.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 선수와 구단, 팬이 오롯이 경기에 몰입하려면 심판에 대한 신뢰는 필수적이다. 오심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통 없는 오심은 용납할 수 없다. “답할 필요 없다”는 태도가 지배하는 순간 심판은 성역이 되고, 구단과 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쌓인다. 구단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문이든 메일이든 전화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 작은 절차가 쌓여야 심판은 다시 존중받을 수 있다. K리그 심판은 성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