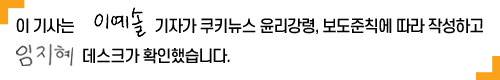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를 둘러싼 20여 년간의 법적 공방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원이 메로나 포장의 독창성과 소비자 인지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식품업계에 퍼져 있던 ‘미투 제품’(히트 상품을 모방한 제품)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1심 법원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메로나 포장에 담긴 투자와 노력을 인정하며 소비자가 포장만으로도 제품을 메로나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로나는 1992년 빙그레가 선보인 아이스크림으로, 당시 귀하던 멜론을 활용해 대중적인 맛을 구현하며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14년 서주가 이름과 형태,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메론바’를 출시하면서 두 회사 간 분쟁이 시작됐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원조 제품이 모방 논란에 휘말린 경우가 잦다. 대표적인 예가 ‘초코파이’다. 1974년 오리온이 개발한 초코파이는 출시 직후 시장을 장악했지만 곧바로 수많은 미투 제품이 뒤따랐다.
오리온은 1997년 자사 대표 제품 ‘초코파이’를 두고 롯데·크라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초코파이’라는 명칭이 이미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브랜드를 넘어 과자류 전체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롯데와 크라운해태 등 경쟁사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조 기업의 무형 자산이 사실상 공공재로 흩어진 셈이다.
삼양식품도 대표 제품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다. 2014년 대표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모방했다며 팔도의 ‘불낙볶음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는 별개로 삼양식품은 해외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을 겨냥한 모방 제품 확산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온라인몰에는 ‘불닭’과 발음이 유사한 이름을 붙이고 포장만 살짝 바꾼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원조 제품이 성공하면 금세 모방 상품이 뒤따른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번지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초코파이처럼 제품명이 보통명사화되면 상표권은 무력화되고, 메로나 사례처럼 오랜 투자와 소비자 인지도가 입증돼야만 승산을 기대할 수 있다.
업계도 이런 ‘미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히트작을 내놔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방 제품이 쏟아지는 업계 관행 때문에 시장이 혼란해지고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곤 한다”며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제품 개발과 출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모방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미주 법무법인 미주 대표 변호사는 “브랜드 보호 수단으로 디자인 등록을 많이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거의 인정받기 어렵다”며 “디자인은 조금만 달라도 보호 범위가 좁고, 상표는 영역이 넓지만 ‘메로나’를 ‘메론바’로 바꾸듯 변형하면 상표권 적용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부정경쟁행위 규정뿐인데, 소비자 혼동 여부와 높은 인지도를 입증해야 해서, 신생업체에겐 넘기 힘든 장벽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미투 관행에 제동을 건 점은 의미 있지만, 업계 전반에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극적이던 부정경쟁행위 인정이 조금 더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너무 쉽게 따라 만드는 카피 문화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면서도 “다만 판결은 사례마다 달라, 법률적 조력이 부족하거나 입증력이 약하면 여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