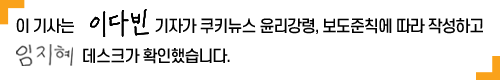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수수료·배달비·광고비에 상한선을 두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미국의 반발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좌초된 뒤 범위는 좁아졌지만 규제 강도는 더 높아져 업계와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됐던 온플법이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되자, 범위는 축소하되 규제 수위는 강화된 법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 제정이 좌초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 조항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대신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와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경고하며 압박한 만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입법 기류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상황을 두고 미국의 압박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디지털 규제 법안 포기를 약속하는 공동성명 서명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초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도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우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도입 국가들에 추가 관세와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경고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과 함께 △망 사용료 부과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IT 업계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한국과 EU는 상반된 대응을 보이고 있다. EU는 미국의 경고에도 ‘디지털시장법(DMA)’을 고수하며 “규제는 EU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시각을 의식해 플랫폼법을 ‘거래공정화법’으로 축소하는 등 입법 방향을 수정한 상황이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광고비까지 상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해, 서비스 이용료 총액에 상한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이 정한 이용료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을 요구 조치 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재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온플법보다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업계는 인위적 상한제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결국 배달앱·입점 점주·라이더·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총량제에 배달비가 포함되면 수수료·광고비가 늘어날수록 라이더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광고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보다 보여주기식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라이더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법이라는 이유로 당장은 통상 분쟁이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시비가 붙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외교·통상 측면에서 법안을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도 규제에 나선 상황인 만큼, 대안 마련이 간단치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제도화 시도를 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