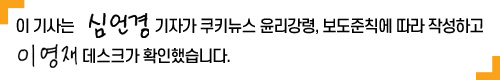윤여정(78)의 직업은 배우다. 그에게 배우란 “연기를 일로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할리우드작 ‘결혼 피로연’을 가지고 부산을 찾았지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대신 “좋게 봐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 담당이 아니다. 연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결혼 피로연’ 기자간담회가 19일 오후 부산 우동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앤드루 안 감독, 배우 윤여정, 한기찬이 참석했다.
먼저 앤드루 안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에겐 특별한 경험이다. 부산에 온 적도, 이 영화제에 온 적도 처음이다.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와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여정은 “종종 와서 앤드루만큼 감동스럽진 않다”면서도 “30년을 이걸 해냈구나 싶어서 뿌듯하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30돌을 조명했다.
‘결혼 피로연’은 제4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이안 감독의 1993년 동명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두 동성 커플의 가짜 결혼 계획을 눈치 100단 K할머니가 알아채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앤드루 안 감독은 원작에 대해 “아시아인의 동성애를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당시에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후 이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다.
리메이크 이유는 성소수자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앤드루 안 감독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안 감독은 “한국인으로서 가족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제 퀴어 친구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결혼과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들뜬 마음들, 불안감 혹은 긴장감,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윤여정은 극중 민의 할머니 자영 역을 맡았다. 당초 자영은 할머니가 아닌 엄마였으나 윤여정의 요청으로 바뀌었다. 이를 비롯해 몇몇 대사나 설정을 앤드루 안 감독과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었다는 전언이다.
“얘(한기찬)가 20대더라. 이건 너무하다고 했다”고 운을 뗀 윤여정은 “독립영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감독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영화나 시리즈에서 그런다면 선을 넘는 거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같이 만드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자영은 민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윤여정 역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남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미국처럼 돼야 한다. 한국은 보수적인 나라다. 한국에서 79년을 살아서 잘 알고 있다. 게이, 스트레이트, 레즈, 흑인, 황인, 이런 카테고리에 레이블을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으로 분한 한기찬은 크리스(보웬 양)와 연인 호흡을, 윤여정과는 조손 호흡을 맞췄다. 자신의 영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원했다는 그는 비대면 오디션을 거쳐 ‘결혼 피로연’에 합류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동성애자 캐릭터보다 영어 연기가 더 힘들었단다. 한기찬은 “영혼을 사랑하자는 생각이었다. 여자고 남자고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영어가 힘들더라”고 돌아봤다.
윤여정에게 ‘결혼 피로연’은 ‘미나리’에 이은 두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이다. 하지만 그가 이 영화를 택한 이유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다. 그는 “배우를 오래 했다. 상을 타고 안 타고는 상관이 없다. 어렸을 때 첫 작품인 ‘하녀’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탔다. 24살이었다. 내가 정말 연기를 잘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상이라는 건 운이구나 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65살 이후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며 “감독이 마음에 들면 감독을 위해 일하고, 스크립트가 마음에 들면 출연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위해 참여했다. 이번에는 제가 교포 감독과 (할리우드작) 인연을 맺어서 그런지, (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신통하고 대견스럽다. 도와준다는 의미로 했다”고 부연했다.
앤드루 안 감독은 ‘결혼 피로연’을 통해 관객들이 영감을 받기를 바랐다. 안 감독은 “모두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을 퍼붓고 표현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실현한 것”이라며 “퀴어인 사람으로서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자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담았다. 퀴어가 가족을 꾸리는 게 꼭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