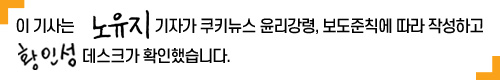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이 관계성 범죄 전력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찰이 반복 신고 같은 ‘위험 신호’를 제때 인식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초동 대응을 강화할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다. 전문가들은 모든 경찰관이 범죄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는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9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세 번째 신고 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추가 안전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 신호’를 놓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다수의 현장 경찰이 동일 주소지 반복 신고 등 위험 신호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임 경찰 중심의 일회성 법령·절차 교육만으로는 관계성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2023년 33만9804건에서 지난해 35만6988건으로 1만7184건(5.1%) 증가했다. 또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중 70건(18%)이 관계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39건(55.7%)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순이었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그럼에도 모든 현장 경찰관을 아우르는 정기·보수교육 규정은 없다. 현재 교육은 가정폭력 담당, 스토킹·피해자 보호 전담 등 일부 직무 관련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허 조사관은 “중앙경찰학교 교육도 법·절차 중심에 치우쳐 젠더폭력 감수성이나 비신체적 학대 훈련은 제한적”이라며 “현장 경찰관 6만여 명 중 상당수는 관련 교육 경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해외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 의무교육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경찰 등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정기적이고 인증 가능한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훈련’을 규정했고, 이를 연방 예산 집행 요건과 연동시켰다. 현재 약 30개 주에서도 경찰·검사·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에게 교제폭력·가정폭력 교육을 의무화했다.
영국 웨일즈도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교제폭력·가정폭력 관련 기초 인식 교육을 받게 하고, 2~3년마다 갱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장 실무자·담당자는 ‘위험 신호’ 감지 등 심화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허 조사관은 “관계성 범죄의 핵심은 반복성”이라며 “이를 파악하기만 해도 피해자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의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압적 통제·비신체적 학대 탐지, 성평등 인식 제고를 포함하는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