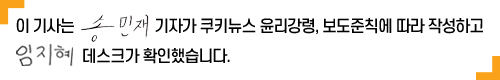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 전략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정면돌파’라는 해법을 꺼내 들었다.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고 전기차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현대차는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오너십과 현지화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美 관세폭탄‧세액공제 폐지…정면돌파 택한 현대차
미국 시장은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크면서도 변동성이 큰 무대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현대차는 2분기 기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폐지되면서, 전기차 판매시 지원받았던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전기차 수요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후퇴 대신 ‘공격’을 택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 투자 규모를 기존 11조6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로보틱스 생태계와 현지 생산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년간 총 260억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전략이다. 이와 함께 관세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555만대로 설정, 이중 60%에 해당하는 330만대를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EV) 등 친환경차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이브리드차’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의 생산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하이브리드차 생산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여파와 전기차 정책 변화 등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위기 순간의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車시장 경쟁력‧수익성 확보’ 등 과제도
하지만 도전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현재 현대차는 대미 수출 시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일본 도요타나 독일 폭스바겐은 약 15%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쏘나타(약 4637만원)가 도요타 캠리(약 4499만원)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미국 관세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2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현대차 경영진은 단기 실적보다 ‘방향 유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보조금 등 외부 변수보다 ‘현지화’와 ‘제품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생존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관세와 무관하게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은 성공하는 시장에선 반드시 현지화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치적 이벤트에 좌우되지 않는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사 전략을 따라가기보다 새로운 모델과 기능을 통한 가격 전략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혀, 시장 변화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경영진이 사업에 대한 그립이 강하고 세일즈 전략이 아주 명확하다고 느껴졌다”며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가 곧 수익성 확보로 이어지는 만큼, 현대차가 단기 전략부터 장기 전략까지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현재는 관세 영향으로 주요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가격 할인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세대 제품 개발부터 핵심 신기술 선점 등 장기적인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