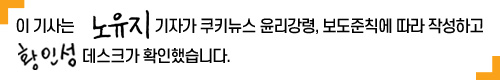청년층이 창업 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오래 버티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내세워 각종 지원센터와 공모전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에 그쳤다. 새로 생긴 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5년 안에 폐업한 셈이다. 특히 30대 이하가 대표인 기업의 생존율은 약 29.4%로 전체 평균보다 더 낮았다. 같은 해 문을 연 신생기업 중 61%가 동세대 청년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18만2462개 기업이 새로 생겨났으나 직전년도 소멸기업 수도 15만154곳으로, 전국에서 경기(20만5053곳) 다음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한 해 동안 총 3조294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는 예산(1750억원) 중 가장 많은 382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늘었지만 성과는 안개 속…“지원 뒤 추적 없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넥스트 로컬’ △식품제조업계 창업자를 육성하는 ‘청년쿡 비즈니스’ △외식업계 상권 분석 등 이론·실전 교육을 지원하는 ‘프렙 아카데미’ 등이 있다.
특히 프렙 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79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생존율도 91%에 달했다.
자치구에서도 청년 창업 관련 지원센터를 조성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로구는 전문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달 새로 단장했으며, 성북구도 비슷한 성격의 ‘안암어울림센터’를 열어 창업 육성 프로그램과 사무공간을 제공 중이다.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매년 ‘청년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를 열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과 프로그램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자치구가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지원 대상의 창업 후 매출 규모나 생존율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만족도 조사나 참여 인원 등이 성과로 제시되는 경우도 흔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창업 이후 매출 규모나 기업 생존율 관련 데이터를 본 적은 없다”며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뒤 연락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음식업 폐업률 13%…“재창업 지원 등 질적 성장 필요”
서울시가 창업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음식업(식품제조·외식업)의 경우 2022년 기준 폐업 사업자가 2만5000명으로 전체 대비 13.1%를 차지했다. 신규 사업자는 2만6000명(전체의 11.1%)으로 나타나 폐업 사업자와 10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준비된 가벼운 청년 창업을 위하여’ 보고서에서도 “청년 창업은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 대리·중개·도급업, 소매업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의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창업가 문화 기반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재창업 기업의 높은 생존율을 고려해 성공 가능성이 큰 재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범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에서 “창업 지원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며 “이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양적 성장을 넘어, 창업지원 제도의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