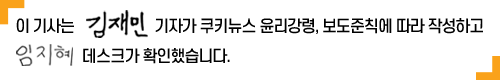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공공주도형과 일반형(민간) 프로젝트의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정부가 강조해온 공공 부문 역할 강화와 국산 기자재 사용에 큰 가산점이 부여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은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공공주도형 입찰(500MW 공고)에 참여한 4개 프로젝트(689MW)는 모두 낙찰됐으며, 일반형 입찰(750MW 공고)에 참여한 2개 프로젝트(844MW)는 모두 탈락했다고 전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은 정부가 20년 동안 일정가격에 전기를 구매해주는 장기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낙찰 사업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 동서발전 등(한동·평대 해상풍력), 남부발전 등(다대포해상풍력), 한국전력기술 등(압해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일반형 입찰에 참여한 덴마크 에너지 투자 기업 CIP(해송3해상풍력)와 명운산업개발(한빛해상풍력)은 고배를 마셨다.
이번 입찰은 가격요건, 주민수용성, 계통수용성 등 비가격요건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공급망(공공-민간 모두 14점), 안보(공공 8점, 민간 6점) 등 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비중도 컸다.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올해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등에 따라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용량 확대는 물론,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 및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를 강조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이번 입찰 과정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는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유니슨 중 하나의 국산 터빈을, 나머지 3개 사업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형에 참여한 CIP는 베스타스 등 유럽산 터빈을, 명운산업개발은 외국 터빈을 유니슨이 조립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 역할 강화, 국내 산업망 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향후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수백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산 등 해외 기자재가 대거 유입돼 국내 생태계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태양광 시장에선 중국산 인버터(전기변환장치)의 보안 문제가 글로벌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망·안보 측면을 강조한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자재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원가를 보조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입찰과 무관한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부족했던 공공 부문을 강화하고 국산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아직까진 국산 기자재 단가가 높은 편에 속해 갑작스레 공급망을 완전히 바꾸기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 부문 입찰 신설 당시 이슈가 됐던 우대가격 등 전기요금 보조 정책들이 민간 차원에서도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산 공급망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기자재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안정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초 열린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통해 “해상풍력의 발전단가(LCOE)를 낮추기 위해선 결국 전체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자재 및 선단 설치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국산화와 효율적 설치 기술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대형 터빈(10MW 초과)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이 부족해 유럽계 제조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터빈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위탁생산 또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국내 생산기반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