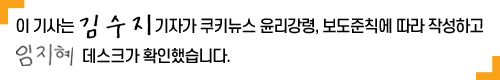자동차 공장을 가득 메운 로봇들이 쉼 없이 차량을 조립하는 장면. 더는 스크린 속 상상이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돌입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로봇 전쟁’이 본격 막을 올렸다. 단순한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자동차 제조업의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의 기존 자동화는 차체 용접이나 도장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공정에 국한돼 왔다. 하지만 라인을 바꾸려면 대규모 설비 교체가 불가피해 최근 늘어난 맞춤형 모델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기업 중 가장 먼저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도입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투입해 ‘파트 시퀀싱(부품 순서 배열)’을 맡기고, 다음 해부터는 용접 등 고위험 공정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목표는 차량 조립 라인의 40%를 로봇화해 로봇 1대가 인력 1.5명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로봇 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원가와 생산지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분석을 내놨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은 밸류 체인이 가장 긴 사업 중 하나로 연력 고용이 많아 파업 등의 리스크가 크다”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공장당 생산성을 6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초기 상용화 가격 목표인 10만달러(한화 약 1억3861만원) 기준으로, 5년간 매일 24시간 투입 시 시간당 비용은 3.4달러(약 4700원)다. 현대차 한국 공장 인건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돼 가격이 3만달러(약 4158만원) 수준까지 하락하면 시간당 비용은 1.2달러까지 내려간다.
재무 전략 차원에서도 로봇 투자는 의미가 있다. 임 연구원은 현대차가 오는 2027년 보스턴다이내믹스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 연구·개발과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면서, 로보틱스를 그룹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본격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중국 BYD 등 해외 주요 완성차 기업들도 잇따라 휴머노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BMW는 미국 공장에서 Figure AI의 휴머노이드를 시험 중이고, 메르세데스-벤츠는 Apptronik의 ‘Apollo(휴머노이드)’를 투입했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치를 제시한 기업은 많지 않다. BMW·벤츠는 휴머노이드 시범 도입 단계에 머무는 가운데,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는 일부 공장에 파일럿으로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대규모 생산라인 도입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반면 현대차는 2025년 10월 조지아 공장 투입, 2026년 고위험 공정 확대, 2028년 양산까지 로드맵을 밝히며 ‘실행력’에서 뚜렷이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완성차 업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파업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품질 균질화와 생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 수가 줄면서 조립 공정이 단순화돼 로봇 투입이 유리해졌고, 사람보다 에러율이 낮아 연간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제작사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가격이 현재 10만달러(약 1억3861만원) 수준에서 대중화 가능한 3만달러(약 4158만원) 선으로 낮아져야 본격 확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소프트웨어 안정성 검증에만 2~3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은 어렵고, 협력사와 부품 밸류체인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휴머노이드 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성공 여부는 가격·안정성·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얼마나 빨리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 조건을 앞서 충족하는 기업이 전기차 전환 이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판도를 선점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