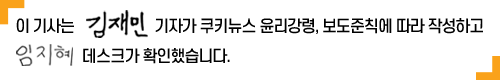급격히 성장한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그림자로, 머지않은 미래에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시장 규모가 여전히 작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9665톤(t)에서 2028년 1만6245톤, 2030년 2만922톤, 2033년에는 4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태양광은 2010년대 후반부터 설치량이 급격히 늘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신규 보급용량만 15.6GW(기가와트)에 달한다. 2017년까지의 총 누적 용량 6.4GW 대비 2.5배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통상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인 점을 감안하면, 2030년대부터 폐패널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패널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백시트, EVA 등 재질로 구성되며, 일부 제품엔 소량의 중금속(납, 카드뮴 등)이 포함된다. 이에 재질별 분리, 열처리 등 안전한 절차에 따라 처리 또는 재활용돼야 하나, 국내에선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사실상 무분별하게 버려져 왔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기준 자체가 없었던 데다 분리수거 품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발생한 폐패널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매립되는 등 무분별하게 처리돼 왔다”면서 “규모가 훨씬 작은 가정용 폐패널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기자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해 재활용 의무량을 부여했으나, 환경부 폐기물 관리시스템 ‘올바로’를 제외하면 관리·규제 체계가 미흡해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듬해인 2024년 말부터 환경부는 수명이 다한 패널의 보관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 재활용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법·제도를 점차 완화해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EPR 제도 운영과 더불어 폐패널 무단 투기·방치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해 여러 노력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도 폐패널 고민은 마찬가지, 대응은 우리보다 빨라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해외에서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지만 대응 속도는 우리보다 빠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EA-IRENA)에 따르면, 폐패널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170만~800만톤, 2050년까 약 6000만~7800만톤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의 폐패널 배출량이 2024년 약 43만톤에서 2035년까지 약 254만톤으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국은 일찍부터 제도적 대비에 나섰다. 오래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온 유럽연합(EU)은 우리보다 10여 년 앞선 2014년부터 태양광 패널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규제 대상에 포함해 재활용 의무화에 나섰고, 유럽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PV CYCLE’을 통해 폐패널 처리 실적 집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15년부터 태양광발전 모듈 수집 및 리사이클법을 도입해 재활용을 규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21년 국내 최초로 개소, 연간 3600톤 규모의 폐패널 처리 능력을 갖춰 수명을 다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북진천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연구센터가 실제 처리 및 실증연구 등을 리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패널 처리 및 재활용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및 인프라 역량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또, 인천에서 폐패널 처리시설을 운영해 온 원광에스앤티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미래폐자원 자원순환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완공되면 연간 1만톤, 국내 최대 규모의 폐패널 처리시설이 될 전망이다.
주요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올해 초 특허청에 ‘EcoRecycle by Qcells(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라는 신규 상표를 출원하고, 지난 6월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약 250MW 규모 태양광 폐패널(약 50만 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고려아연과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앞선 해외 주요국은 원재료 회수율 향상 기술, 고효율 박리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면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EPR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패널 통계 정확성 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