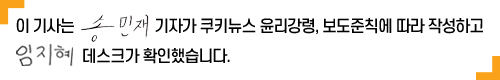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최종 확정하면서, 한국 완성차 업계가 수출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더 이상 관세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려왔던 0% 관세 특혜가 사라지고,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TA 수혜 실종’ 日·EU와 경쟁 심화 예고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15%로 결정됐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내걸며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측이 최소 15%를 고수하면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기존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던 일본과 유럽 등과 달리 한미 FTA에 따른 수출 관세 0%를 적용받던 한국의 경우, 관세 15% 협상으로 사실상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지표 역시 한국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는 기본 2.5%의 관세를 부담하면서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각각 14.6%·8.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5.7%·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이번 관세 협상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경쟁국과의 제품 생산효율성 향상부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 향상·비용 절감’…경쟁력 강화 핵심과제
전문가들은 관세 우위가 사라진 상황에서,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품질 경쟁력과 원가 절감을 지목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만진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제품의 품질 향상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국내 자동차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학계·산업계 손잡고 위기 돌파해야
업계는 이번 관세 협상을 전환점으로 삼고, 구조적 체질 개선과 전략적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며 “정부·학계·산업계가 전략적 협력체를 구성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기술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자동차 산업과 AI 산업을 연계한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커리큘럼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수 과제로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전동화·디지털·AI 환경에 맞춰 대학교 커리큘럼도 따라가야 하지만 현재의 커리큘럼을 들어다 보면, 내연기관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커리큘럼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기업으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가 힘을 모아 현재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