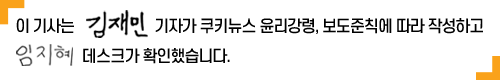지난 40년간 총 2773억㎾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해 온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4호기가 계속운전 결정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가동을 멈췄다. 향후 5년 내 원전 총 10기의 운전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추진 여부에 따라 막대한 전력공급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985년 8월7일 운전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한 고리4호기가 지난 6일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95kW(킬로와트) 규모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인 고리4호기는 40년 동안 부산 시민 전체가 약 12.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왔지만,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멈췄다.
우리나라의 원전 운전허가 기간은 40년으로, 설계수명 만료 후 가동 유지를 위해선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등을 검토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균 3년6개월(4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 가동을 멈춘 원전은 관련 법에 따라 2020년쯤부터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 운전허가 기간 종료 전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고리3·4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도 제출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현재는 2·3·4호기 모두 멈춘 상태다.
문제는 앞으로 운전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전남 영광 소재 한빛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9월 한빛2호기의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경북 울진 소재 한울1·2호기는 각각 2027년 12월과 2028년 12월, 경북 경주 소재 월성1·2·3호기는 각각 내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운전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2·3·4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운전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셈인 것. 이들 원전의 합산 시설용량은 8.45GW 규모다. 8.45GW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이며, 이는 서울시 한 해 전력소비량(약 4만8800GWh)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수원은 원전 10기의 안전성을 기 확보한 만큼 추가적인 가동 중단 없이 계속운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2·3·4호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한울 1·2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고서도 제출했다”며 “월성 2·3·4호기 역시 지난 4월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고리2호기는 올해 12월, 고리3호기와 4호기는 내년 6월까지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창현 한수원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장은 “원전 정지로 인한 부족 발전량을 타 발전원으로 대체하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운전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 자체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계속운전 기간은 20년으로, 우리나라의 10년보다 2배 길다. 그러면서도 설계수명 임박 시 주기적안전성평가 없이 안전성·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 한국의 평균 심사기간(42개월)보다 짧다. 공청회 필요 시 심사기간은 30개월 내, 공청회 없이는 22개월이 소요된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심사 기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적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엄격한 편”이라며 “여기에 운영변경허가 등 인허가 과정이 추가되고 설비개선 착수 과정까지 합치면, 현행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설계수명기간 만료 20년 전부터 할 수 있게 변경하거나, 계속운전 기간 확대 및 계속운전 허가 이후부터 계속운전기간을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