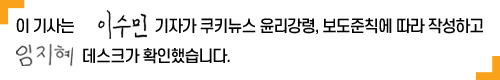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선업계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원·하청 구조를 지닌 국내 조선업계의 특성상 이번 법 제정이 원-하청 갈등의 폭을 키우며, 조선업계 성장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 기술력과 납기 신뢰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온 조선업계에선 이번 법 제정을 두고 최근 늘어난 수출 물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는 쟁의행위 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 범위의 모호성이 노·사 간 신뢰성을 약화한다고 지적한다.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확대 범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업 책임의 한도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쟁의 행위에서 상대방의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실질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행위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실질적 지배성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이다. 법조계는 실질적 지배성의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 입장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면이 업계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회는 전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동업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청업체와 기업 간 기울어진 관계가 이제야 비로소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라며 “원청까지 교섭 대상이 확대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법 제정으로 오히려 원·하청 갈등이 심화하고, 생산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 수만 해도 각각 2420곳, 1430곳에 달한다. 원청 사업주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교섭을 거부할 경우 업체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교섭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후폭풍이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의 법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TF를 통한 정부의 대응과 구체적 기준점 마련이 소송의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다만 기업이 촉구하는 즉각적 법적 대응 장치 마련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연한 법 적용을 위해 시행 초기 발생하는 불가피한 법적 추상성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해소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 주도 시행령 마련 등 지금 보다 강력한 보완 방향이 확정돼야 비로소 현장 불안감이 최소화된다”며 “TF 구성만으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간의 노동부의 매뉴얼 마련은 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 전반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상황을 이끌어갈 장치가 필요하며,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수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이해 당사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또한 “이번 법안은 일률 적용 원칙이기 때문에 업계별 차등 적용이나 속도 조정, 계도 기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다”라며 “법이 국회를 통과해 버린 현 상황에서 결국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 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중재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