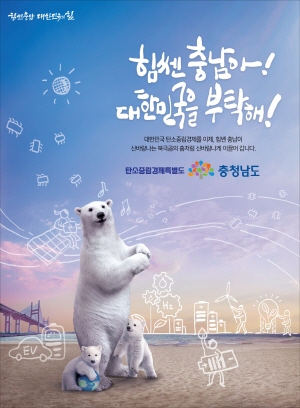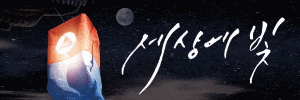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3)는 17세기 프랑스 로렌 지방 출신의 화가로, 그의 작품은 세속적인 삶과 도덕적 메시지를 절묘하게 결합한 풍속화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630년에 제작된 <점쟁이>는 당시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건을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집시, 매춘부, 도둑 등 사회 주변부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투르가 로마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작품 전반에는 카라바조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이 그림은 라 투르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인 <회개하는 막달레나>와 함께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쏜살같이 움직이는 눈동자와 분주한 손길은 차분한 인물들 사이에서 매혹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는 17세기 북유럽에서는 판화로, 로마에서는 카라바조의 추종자들에 의해 대중화된 소재였다. 이 그림에서 시선의 교차와 몸짓의 안무는 젊은 남성이 노파 점쟁이와 패거리들에게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인물들의 구도는 극적인 정경을 암시하고 있어 관람자를 그림 속 이야기로 유혹하고 있다.
잘 차려 입은 젊은 남자의 우아한 모습과 점쟁이에게 내미는 눈에 띄게 더럽혀진 손톱 사이의 대조는 사건의 진정성에 더욱 의문을 제기한다. 경찰이 범죄현장을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이며 젊은 남자를 고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남자의 눈초리와 진중한 턱 그리고 하관의 선은 집시에게 점치는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이미 이들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침착함이 엿보인다.
범죄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순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21세기에도 17세기처럼 로마나 파리 등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를 간다면 주의해야 한다. 몇 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초저녁 탱고 공연을 보러 가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 사진 찍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데, 검은 헬멧부터 올블랙으로 무장한 남자가 역주행을 하며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급 발진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재빨리 폰을 챙겨 다행히 날치기는 면했다.
라 투르는 고급 패브릭의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을 즐겼다. 가장 왼편에 수 놓인 면 블라우스 소매가 더 강조된 여인, 검은 머리를 고리처럼 묶은 여인의 리넨으로 된 성글게 짠 칼라, 14~17세기에 즐겨 착용하던 꼭 끼는 상의인 가죽 더블렛(doublt)을 입은 남자, 검고 주름진 집시의 얼굴과 대조적인 주홍색 소매는 짧고 고운 털을 촘촘하고 돋아나게 짠 비단인 빌로드라고도 불리는 벨벳(velvet)으로 보인다.
어릴 때 할머니와 엄마가 홍콩에서 수입한 비로도로 된 한복을 입으셨는데, 엄마의 수박색 한복치마에 머금은 묘한 빛 반사와 부드러운 촉감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다. 큰 무늬를 입체적으로 직조한 노파가 덧입은 자카드(Jacquard) 등 원단의 특성이나 재질의 짜임에 따라 옷감의 표현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했다.
라 투르는 2차원의 캔버스에 빛 반사와 인체의 볼륨감을 표현한 흩어진 흰색 페인트의 터치로 3차원의 살아 숨쉬는 듯한 입체감으로 인물을 완벽하게 창조해 냈다.
남자의 바지에서 돈주머니를 꺼내는 가장 왼편에 있는 여자부터 스카프를 쓴 여인까지 네 사람의 얼굴의 밝기는 점점 크리센도(crescendo)로 치닫는다. 젊은 남자의 얼굴을 코를 경계로 좌우로 나눠보자. 빛은 왼쪽에서 들어와 왼쪽 머리부터 금발, 목을 덮은 칼라에서 어깨를 타고 분홍색 소매까지 가죽 더블릿에 팔과 손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캔버스 왼쪽이 잘려 나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여인의 행동을 부각시킨다. 대신 화가는 서명을 하기 위해 오른편 캔버스 조각을 덧붙여 놓았다.

각 인물은 풍부하고 세심한 조합으로 완성된 화려한 색으로 차려 입고 있다. 이 유명한 그림은 20세기 중반에 발견되었으며, 화가의 프랑스 북동부의 고향인 로렌의 이름이 적혀 있어 “카라바조의 선례와 독립적으로 이러한 작품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라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

17세기 유럽 회화의 거장이었던 라 투르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오랜 세월 영토 분쟁이 이어졌던 로렌 지방 출신으로, 그의 삶은 마치 그림 속 어둠처럼 베일에 싸여 있다. 약 30여 점의 걸작들이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 흩어져 있지만, 그중 정확한 제작 연도가 명시된 작품은 단 두 점뿐이다.
‘태양의 화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그는 부인의 고향인 뤼네빌에서 조용하고 은둔적인 삶을 살았다. 그가 생전에 상당한 명성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개인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점쟁이> 인물들의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점쟁이가 그의 주의를 끄는 동안, 공범들은 그의 주머니를 털고 어깨에 찬 귀금속 메달과 줄을 자르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엘리스 슈바르츠(Alice Schwarz)는 이 장면을 두고 “클로즈업 된 손들이 교향곡 같다. 동시에 일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칠고 더러운 손에 매료되고 흥분된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손의 움직임은 이 작품의 핵심적인 서사 장치다.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또 다른 대표작, 〈회개하는 막달레나>는 그가 평생 탐구해온 종교적 주제를 정제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어둠 속에서 은은히 타오르는 촛불은 거울에 반사되어 이중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고요한 명상과 내면의 울림을 자아낸다. 죄를 지은 여인은 적막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그녀의 손 아래 놓인 해골은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바니타스(Vanitas)의 전형으로, 죽음과 회한, 그리고 영적 각성을 암시한다.
바니타스는 16세기와 17세기 네덜란드 및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한 상징적 정물화의 한 갈래로, 흑사병과 30년 전쟁이라는 시대적 비극과 맞물려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되새기게 한다. 라 투르는 촛불 그 자체를 화면에 등장시키며, 마리아 막달레나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듯한 인상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명상은 단순한 회개를 넘어, 깊은 자기 성찰의 형태로 확장된다. 거울 속에 잠긴 영혼의 이미지는 관람자에게도 조용한 울림을 전한다.
그는 40대 이후 촛불을 주요 모티브페로 삼아, 밤의 장면을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으로 표현했다. 이 불꽃은 인물의 표정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드러내며, 주변의 어둠과 인물을 분리시켜 고요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라 투르는 움직임 없는 인물과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을 선호했으며, 이를 통해 시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창조했다. 이러한 절제된 기하학, 극적인 명암 대비, 그리고 내면을 향한 시선은 바로크 회화의 화려함과 과시적 성향에 대한 조용한 반향으로 읽힌다.
카라바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측면광을 통해 빛을 암시했다면, 라 투르는 촛불이라는 빛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화면에 담아내며, 그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했다. 촛불은 단순한 조명 이상의 존재로,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의 작품은 육체적 쾌락을 내려놓고 참회와 명상의 삶을 선택한 인물들의 영혼을 조명하며, 단순함 속에서 깊은 감정을 이끌어낸다.
일상 속에서 시적 정서를 표현해낸 라 투르의 회화는 17세기 유럽 회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같은 시대의 화가 중에서는 네덜란드 델프트에 살았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페르메이르 정도만이 그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최금희 작가는 미술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을 답사하며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미술 사조, 동료 화가, 사랑 등 숨겨진 이야기를 문학, 영화, 역사, 음악을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50플러스센터 등에서 서양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86)](/data/kuk/image/2025/09/14/kuk20250914000106.jpg)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85)](/data/kuk/image/2025/09/07/kuk20250907000020.jpg)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84)](/data/kuk/image/2025/08/30/kuk202508300000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