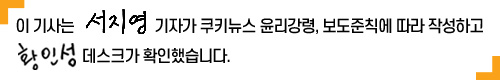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당연한 말이다. 서울시민 상당수는 정신질환도 치료 가능한 병이며, 언제든 자신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이 아플 때 이들 절반가량은 병원을 찾기보다 ‘곧 나아지겠지’라며 증세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현실의 위험한 괴리를 줄일 사회적 처방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6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간한 ‘202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5명(53.4%)만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대비 6.4%p 감소한 수치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최근 1년간 겪은 가장 큰 정신적 어려움은 ‘심각한 스트레스(41.3%)’였다.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4.8%)’, ‘우울감(31.4%)’, ‘불안(31.2%)’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항목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의 ‘한국 사회동향(2023)’에 따르면 자살 시도의 직접적인 동기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조차 방치하면 중증으로 발전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알지만 외면하는 현실, 왜?
문제는 시민들이 치료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45.6%)’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족·친구에게 이야기한다(41.8%)’가 뒤를 이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인 증세라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48.5%)’였다. ‘도움의 효과를 불신해서(23.2%)’, ‘도움받는 과정이 번거로워서(11.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는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태도와 맞닿아 있다. 조사에서 76%가 ‘나도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았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면 이를 축소하고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해결책은 ‘문턱 낮은’ 사회적 안전망
시민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약 87%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도구 보급 △정신건강전문의 상담 제공 △지원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 발굴 등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시민이 여전히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4.8%)’고 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응답자의 38%가 정신건강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 등에서 얻는다고 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컸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공공 캠페인과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서울 거주 만 15~65세 미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