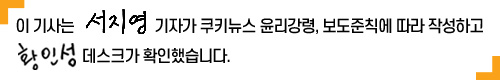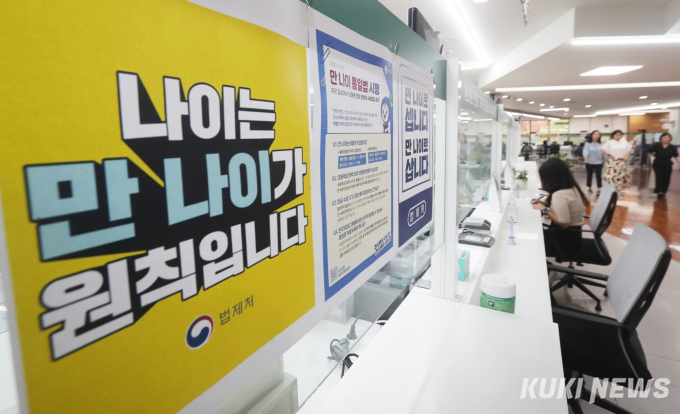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만 나이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나이를 계산하거나 말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혼란의 원인을 법이 아니라 언어와 관습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만 나이 얘기하나요, 한국 나이(세는 나이) 말하나요?” “사람들에게 나이 알려줄 때 기준이 헷갈린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만 나이’가 법적 기준이 됐음에도 여전히 혼돈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23년 6월 도입됐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해 계산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출생 시 1세부터 시작해 해가 바뀌면 1세 증가)를 사용해 왔다.
실제 만 나이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혼용돼 쓰이고 있다. 2001년생 김민수씨는 “익숙해서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며 “만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고, 주변 친구들도 세는 나이를 쓴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30)씨는 “나이만 말하면 꼭 출생연도를 묻길래, 번거로워도 출생연도와 세는 나이를 함께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모(46)씨는 “보통 우리 또래는 제 나이를 말한다”며 “50세에 가까워지면 띠를 먼저 말해, 크게 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50대 서모씨는 “간혹 세는 나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법이 바뀐 만큼, 만 나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계산하기에 번거롭지 않고 주변에서도 거의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의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관습을 지적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이미 1962년에 시행된 법과 다르지 않지만 현실에 정착하지 못한 건 법이 아니라 관습과 언어의 문제”라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호칭이 정해지는 문화가 통일에 재통일을 해도 세는 나이가 없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만 나이 통일이 왜 안 되는지 그 이면에 숨은 우리의 호칭 등 언어 문화를 돌아볼 때”라고 조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나이 문제는 과도한 가족주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가운데 호칭을 확대하는 문화가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또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