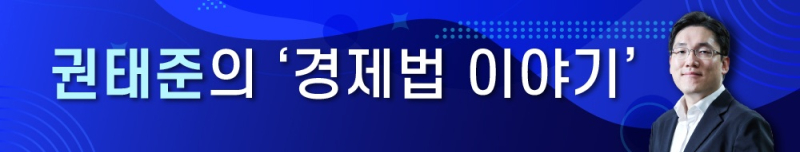
그러나 세법은 다르다. 세법은 매년 일정한 주기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무렵 그 해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각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가 3개월 동안 이를 심의하여 12월에 처리하는 식이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3년 무렵부터 매년 빼놓지 않고 이듬해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있다.
세법은 매년 바뀌면서, 많이 바뀌기도 한다. 2010년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경제부총리에게 “매년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세제 개편 항목이 400개가 넘고 또 최근 5년간 조세 개편 항목 수가 2,272개”라고 지적하자, 경제부총리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개편항목의 수가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매년 적지 않은 수의 항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고 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도 백수십 여개의 항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함께 심의하여 세법 개정에 반영된다.
세법이 이렇게 자주, 많이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정부로서는 사회변화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앞서 소개한 2010년 국회 질의 답변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답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왜 수긍하기 어려운가,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하다가, 2008년 공제금액 30억 원을 한도로 대폭 개편됐다.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한 상증세법 조항은 2023년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9번 개정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래 공제대상 가업의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었는데, 그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한다거나(2009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졸업 후 연매출 1,50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거나(2011년), 다시 그 매출액 규모를 2천억 원 이하(2013년), 3천억 원 이하(2014년), 더 나아가 중견기업에 대해서까지 확대한다거나(2022년), 아예 연매출 5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식이었다(2023년).
이쯤 되면, 애초에 2008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할 때 무슨 생각과 철학이 있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세법 개정이 광범위하고 잦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도 국회도 일관된 조세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같다.
조세제도처럼 복잡하면서 동시에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많이 바뀐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변화인가 되묻게 된다.
매년 11월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지나면, 12월에 세법이 또 뭉터기로 개정될 예정이다. 어쩌면 우리는 세법 자체보다 조세제도를 위한 담론을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
권태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