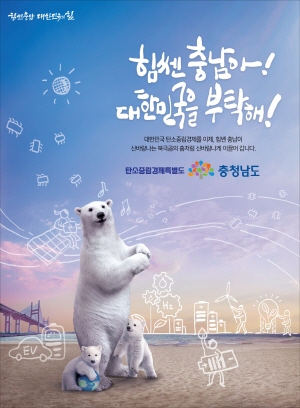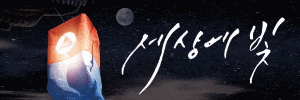지난 8일 천안예술의전당 가까이 문 연 ‘취묵헌서예관’을 사흘 지나 찾았다. 취묵헌(醉墨軒) 인영선(1946~2020) 선생은 지역을 대표하는 서예가다.
그를 처음 대면한 건 2014년 5월 초였다. 서예 문외한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그가 ‘일중서예상’ 대상을 탔다는 기쁜 소식에 용기를 냈다. 한국서예계 대가 일중 김충현(1921~2006)을 기리는 최고의 상을 취묵헌이 수상한 것이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그때 감흥이 새록새록 난다. “다른 재주가 없어 한 길로 글씨나 쓰며 살자는 게 벌써 40년이 넘었다.” 70세를 목전에 둔 그는 인생을 달관한 경지를 보였다.
서체가 자유로웠다.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다. 그때 그는 “모름지기 글씨란 내 모습 생긴대로 쓰면 그만이다. 세간의 호불호를 떠나 내가 좋아하며 즐기면 족하다”고 했다. 이번 개관특별전 제목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 사람을 닮는다’가 이런 그를 대변한다.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한 그는 글 짓는 것을 즐겼다. 1990년대부터 문인화를 그렸다. “내가 좋아 붓을 들었고, 흥이 일 때마다 글을 지었다. 보잘 것 없지만 그것도 내 흔적이니 즐길 따름”이라고 말했다.

취묵헌서예관에서 그의 글이 담긴 8폭 병풍을 만났다. 57세 때인 2002년 추석에 쓴 한글 작품이다.
“그 놈의 외통수 고집만큼은/ 세월도 어쩌지 못하여/ 늘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 되지 않는 일에/ 醉하여 개었다 흐렸다를/ 반복하는 日常을 사나보다.”
취묵헌은 술을 좋아했다. 2004년 한 작품 아래 작은 글씨로 “술에 취하지 않고는 글씨를 쓸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인터뷰 당시 몇 년 전 당뇨 때문에 술을 끊고 현재는 담배도 끊었다고 했다.
이 병풍에 그는 의사의 경고를 담았다. “몸 관리 하시면서/ 작품 하시고 한 두잔씩 하시던지/ 폭음하시고 붓 놓으시던지…” 금주 의지로 이 글을 쓰고도 그는 바로 술을 끊지 못했다.
그의 서예 입문은 우연이다. 세 살 때 여섯 살 위 형의 서예 개인교습을 보면서 먼발치서 익혔다. 고교(천안농고) 때 교장실 미화용으로 쓴 글씨가 서예가인 교육청 학무과장 눈에 띄어 배움을 받게 됐다. 그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임서(臨書)에 소질이 있어 한 번 본 글씨를 기억해, 따라 쓰면서 익혔다.
예술의 길은 고단했다. 왕희지의 ‘난정서’를 수천 번 썼다. 이 행서체 글로 여섯 번 낙선한 국전에 1976년 입선했다. 서예가 평생의 길이 됐다. 그는 뭔가 그리울 때 붓을 잡았고, 또 벼루의 갈증을 달래러 먹을 갈았다고 했다.
“뒤통수가 가려운 걸 보니/ 뒤에서 누가 날 부른가 보다/ 뒤 돌아보니 날 부른 이는/ 아무도 없고 빈 바람뿐/ 그리움을 몰고 온 것은 바람이었나.” 그는 이어 “그리움은 창작의 원천이다/ 그리움은 늘 묵 마르게 하고/ 갈증을 달래려고 먹을 간다”고 병풍에 썼다.
이 병풍에는 할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 담겼다. “생전에 약주를 좋아하셔/ 내 죽은 뒤에 젯상에/ 눈깔만한 잔 놓지 말고 대접에 따르라던” 할머니. 부친은 서당 선생님이었다. “학동들 글소리 파한 천렵엔 말석의 꼬마는 상석의 훈장님 옆 차지”한 취묵헌이었다.
그는 돌아가기 1년 전 웅혼한 필치로 ‘복귀영아(復歸嬰兒)’ 네 자를 썼다. 화제(畵題)는 ‘다시 어린아이 경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였다.
이 서예관은 천안시가 예술인을 기리며 최초로 지은 기념관이다. 예술인기념관이 많은 관람객을 끌고 온다는 것을 안 걸까. 10여년 전 한 교수가 자신이 평생 모은 근현대 시집을 기증하겠다는 걸 거부한 천안시다. 그게 ’山史현대시100년관‘으로 태어나 백석대의 보물이 됐다. 이제 취묵헌서예관이 천안의 보물이 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