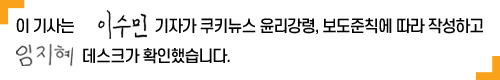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 안보 대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안정적 전력 공급‧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으로 SMR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를 차세대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표준화 선점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하루빨리 비전과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익래 한국수력원자력 SMR 건설준비센터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 토론회에서 “원자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걸맞는 SMR만의 특장점들이 부각되며 미래 에너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며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입지 제약이 적은 분산형 전원 기능, 다목적 활용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석탄 에너지는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비와 간헐성 문제로 안정적 전력 공급과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 유럽 등 세계는 파리협약 이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높은 발전 단가와 출력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MR은 친환경성과 안정성, 경제성을 겸비한 중간지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SMR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글로벌 패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최근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과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해 SMR은 피동형 안전 설계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공장 제작과 모듈 공법을 적용해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높은 가격과 초기 투자 비용, 국가별 기술 표준 불일치와 인허가 문제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국내 기술력 확보’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설계 능력뿐 아니라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SMR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제작 능력이 독보적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SMR 모델 개발을 목표로 2025년 표준설계 완료, 2028년 SDA 취득, 2030년 초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SMR의 개발을 넘어 ‘세계적 클러스터’로 도약해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기술 경쟁뿐 아니라 시장 진출에 나서야 하며, 그렇게 세계적 SMR 파운드리 거점이 되면 국제적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은 NuScale Power를 중심으로 77MW급 SMR 설계 인허가와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 아래 실증 및 배치가 활발하다. 중국은 2010년대 초부터 SMR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해양플랜트·원격지 공급을 목표로 상업 운전을 실증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극 등 극지방에 부유식 SMR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하며 기술 실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움직임 속에서 글로벌 SMR 기술 개발과 이에 따른 상용화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다.
정 교수는 “국제적으로 90여개 SMR 시장이 존재하며, 결국 진행 중인 패권 경쟁으로 살아남은 일부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타국 규제에도 적합한 국제 표준으로서 한국이 도약해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반연구소장도 “각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패스트 팔로잉(Fast Following) 전략을 펴고 있다”며 “한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성 확보‧ 기존 대형 원전 중심 규제 탈피‧ 국내 실증 활성화‧ 공급망과 인력 기반 확보‧국민 수용성 증진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웅 국회의원은 “한국이 I-SMR 개발을 진행 중이나, 글로벌 경쟁과 해외 시장 전략, 국민 수용성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여전하다”며 “과제 극복을 위해 정부 투자와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