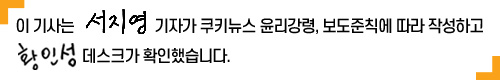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단순한 행사 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치매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9월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1995년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지정한 국제기념일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치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어려움을 준다”며 “저 역시 치매를 앓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는 치매 어르신이 약 16만 명 있다”며 “시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해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도 기념식과 캠페인이 열렸다.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기념행사에서 치매 예방과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161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문제는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고 20년 뒤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치매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조기 발견이다. 치매 진단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낙인’이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불치병에 걸린 것으로 여기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경로당 출입이 제한되거나, 부양 부담이 커진 가족이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한다”며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하루 6~9시간이 소요되고, 연간 2072만원의 돌봄 비용이 발생해 시설 입소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다.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 개선은 더디고, 치매 관리 시설과 돌봄 인력 등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치매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부산가톨릭대 부교수도 “치매 노인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과 치매친화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