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명보 감독이 스리백 전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비진을 재편했다. 그러나 브라질전 0-5 대패는 실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파라과이전에서는 일정 부분 안정감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완성도는 숙제로 남았다. 내년 월드컵 본선 개막 전까지 스리백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명보호는 지난 9월 A매치 2연전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전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로운 수비 형태 속에서도 압박과 라인 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브라질전은 달랐다. 수비 라인은 경기 내내 흔들렸고 빌드업 실수와 역습 대응 실패가 겹치며 0-5로 완패했다. 브라질의 빠른 전개에 라인이 쉽게 무너졌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도 끝내 맞춰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스리백은 좌우 스토퍼가 맨투맨 수비로 상대 윙포워드를 제어하고 정중앙 스위퍼가 커버하는 진형이다. 스위퍼는 수비 전체 밸런스를 조율하며 공간을 관리해야 한다. 수비와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필수다. 윙백 역할도 핵심이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내려 안정성을 보강하고, 공격 시에는 윙어처럼 전진해 전개를 돕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좌우 윙백으로 나선 이태석과 설영우는 수비에만 머물렀고 황인범과 백승호는 고립돼 빌드업을 원활하게 이끌지 못했다. 이강인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도왔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공격은 롱볼 위주로 단조로워졌다. 손흥민은 공중볼 경합형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브라질의 에데르 밀리탕·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공중전에 강했다. 윙백이 오르지 못하자 공격 전개는 막혔고 중원에서부터 밀렸다.
더 큰 문제는 5명이 수비에 섰다 해도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실점 장면에서 수비진이 모두 페널티박스 인근에 있었지만 패스 한 번에 공간을 내줬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김민재가 전반전 많은 공간을 커버했지만 후반전 들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실점하기도 했다.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든 점도 문제였다. 두 명의 미드필더로는 상대를 감당하지 못했다. 비니시우와 호드리구가 밑으로 내려와 수적 우위를 만들었고 황인범, 백승호는 압박과 전환 모두에서 밀렸다. 가끔 김민재가 지원했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이를 예상하고 그때마다 영리하게 공을 돌려 체력만 소모시켰다. 결국 수비와 기동력 모두를 갖춘 미드필더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대패는 스리백 실험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력 미완성을 보여준다. 단순히 개별 수비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라인을 올릴 때는 압박이 늦었고 내릴 때는 커버가 느렸다. 수비와 중앙 간격이 벌어지며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졌고 빌드업 단계에서도 후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결국 수비 숫자를 늘려도 전술 구조가 완성되지 않으면 불안은 되풀이된다.
홍 감독은 스리백 전술을 통해 안정적인 빌드업과 라인 조절을 동시에 잡으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아직 거리가 꽤 있다. 스리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센터백 간 거리·윙백 수비 위치와 공격전개·미드필더 빌드업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 ‘움직임의 합’을 얼마나 빠르게 완성하느냐가 관건이다.
파라과이전에서도 홍 감독은 스리백을 유지했다. 그는 1대1 수비에 강점이 있는 김민재를 왼쪽 스토퍼로 배치해 전방 압박과 빌드업 기여 범위를 넓혔다. 박진섭이 중앙 스위퍼 역할을 맡았다. 경기만 놓고 보면 브라질전에서 드러난 불안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팀 전체 압박 타이밍이 개선됐고 빌드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상대적 약체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한 결과라 향후 강팀과 실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홍명보호 스리백 실험은 이제 단순한 ‘전술 실험’을 넘어 시간 싸움이 되고 있다. 내년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전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선수 간 호흡, 역할 이해도, 실전 대처 능력까지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 스리백이 ‘위험한 도전’이 될지 아니면 한국 축구의 새로운 틀로 자리 잡을지는 이 시간 동안 진화 속도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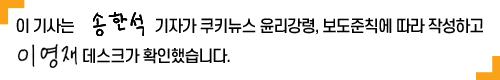






![손흥민 “항상 90분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쿠키 현장]](/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464.jpg)
![홍명보 감독 “선수들이 브라질전 대패 극복한 게 가장 큰 수확” [쿠키 현장]](/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462.jpg)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 “한국과 일본 스리백, 월드컵에서 경쟁력 있을 것” [쿠키 현장]](/data/kuk/image/2025/10/14/kuk202510140004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