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착공 물량 공급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줄다리기 속에서 민원과 행정 부담은 오롯이 자치구의 몫이 되고 있다. 폭증하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기 위해 팀 전체가 투입된 자치구도 있었다.
정부는 규제, 서울시는 개발…엇갈린 정책에 혼란 커져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이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기존 토허구역으로, 20일부터 나머지 21개 구에도 토허제가 확대 적용됐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거래 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같은 대책은 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신통기획 2.0)’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인다. 신통기획 2.0은 한강벨트 선호지역에 6년간 총 19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성동구 등 토허구역 확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더 이상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의 전화만 수십 통…토허제 확대에 자치구 ‘비상’
현장 혼란은 커지고 있다. 성동구에선 대책 발표 직후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허가 민원 담당 인력도 기존 1명에서 팀 전체로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발표 이후 거래 허가 가능 여부나 요건, 절차 등을 묻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급한 대로 팀원 모두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 관계자는 “하루에 전화로만 4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어제부터 문의가 몰리면서 민원 처리 인력을 1명 더 늘렸다”고 전했다. 반면 앞서 3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정 당시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해 초기 혼란을 겪은 셈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허가 신청 건수도 많았지만, 특히 서류 작성법 등을 묻는 문의가 많았다”며 “전화와 방문 상담을 원활히 처리하려면 인력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선 10·15 대책 지적만…전문가 “공조 필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0·15 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며 “발표 직전 유선으로 통보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효과로 가격 안정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정책을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실수요자는 장기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수요 누적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구청의 행정 부담도 커지고 정비사업 지연으로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정책 공조를 강화해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 운영과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조율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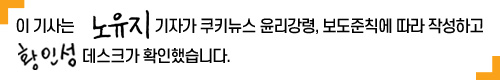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외국인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2025 국감]](/data/kuk/image/2025/10/23/kuk20251023000073.jpg)
![국토부 “부동산 투기 세력 대응 ‘강력 조직’ 필요” [2025 국감]](/data/kuk/image/2025/10/23/kuk20251023000222.jpg)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 논란 해명…“객관적 기준으로 산정”[2025 국감]](/data/kuk/image/2025/10/23/kuk20251023000147.jpg)


































